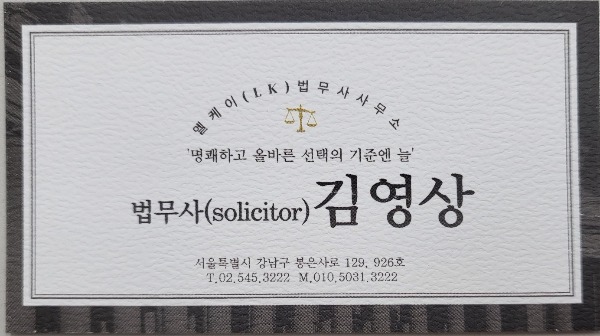"미키17" : 존재와 실존의 경계를 탐색하다

I. 서론 | 존재를 향한 질문, 그리고 영화적 해석
에드워드 애쉬턴의 소설 "미키7"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키17은 봉준호 감독의 독창적 해석을 통해 2025년 2월 개봉되었다. 원작이 과학기술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조명했다면, 영화는 실존적 고뇌와 내면적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철학적 사유를 유도한다. 특히, 인간 정체성과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주인공의 여정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진다.

II. 존재론적 문제 | 복제와 정체성, 그리고 의식의 연속성
미키17의 중심에는 복제된 존재의 정체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키는 죽을 때마다 새로운 육체로 재생되지만, 그는 여전히 동일한 인간인가? 이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존 로크의 인격 동일성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정신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곧 존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가? 영화는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감성적인 접근과 시각적 서사를 통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III. 실존주의적 시각 | 부조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창조하다
미키의 끝없는 죽음과 재생은 카뮈의 시지프스 신화를 연상시킨다. 죽음이 필연적이고 삶이 부조리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명제처럼, 미키는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그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기 존재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책임지며 의미를 형성한다.

IV.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 | 기억, 관계, 그리고 타자성
영화는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화한다. 정체성이 기억과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가? 이는 마르틴 부버의 ‘나-너’ 철학 및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미키는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유대 속에서 진정한 존재로 자리 잡는다. 그의 관계성과 연속적인 경험은 단순한 개체로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성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V. 봉준호 감독의 해석 | 인간성과 사회적 메시지
봉준호 감독은 미키17을 단순한 SF 서사로 그리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회복력과 사회적 비판 요소를 결합해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존의 차가운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미키의 존재를 보다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유대라는 요소를 통해 생존 너머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VI. 결론 | 철학과 SF의 융합, 그리고 열린 질문들
미키17은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현대적 존재론과 실존주의를 재해석한 철학적 탐구이기도 하다. 영화는 인간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며, 봉준호 감독 특유의 감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존재론적 질문과 실존적 고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인간 본질에 대한 열린 이해를 제시하는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